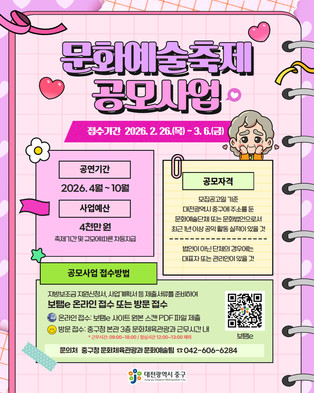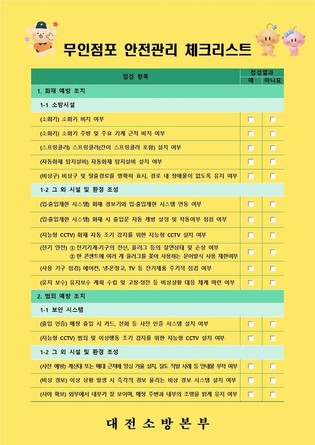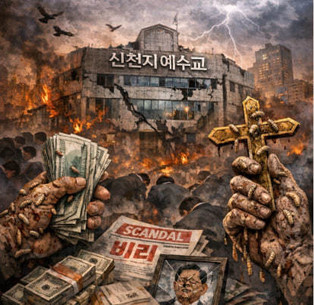|
| ▲ |
코스피가 세계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른 데다, 정부까지 투자를 적극 권하면서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청년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순 없다’라는 ‘포모(FOMO │ Fear Of Missing Out │ 기회 상실 우려)’ 심리가 강하게 발동한 것이다. 지난주 주가 급락의 충격을 한바탕 겪었는데도 청년층의 투자 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번 ‘빚투’ 광풍이 사회 구조적 불안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2030 청년세대는 근로소득으로는 치솟는 집값과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도 불사하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라는 착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2021년에도 신용융자 잔액이 25조 원을 넘었을 때, 코스피는 반년 만에 1,00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쳤다. 이번에도 개미들만 반대매매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6일 코스피(KOSPI)는 4,026.45로 마감하면서 0.55% 상승했다. 앞서 3일 4,221.87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미국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4, 5일 이틀 만에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지난 11월 10일 재반등하며 4,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주가 반등은 동학개미들이 주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흘 연속으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장’에 뛰어드는 청년 개미들은 계속 늘고 있다.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청약통장을 깨 투자에 나선 회사원, 결혼자금으로 물려받은 오피스텔을 팔아 주식을 사는 청년들까지 등장했다. ‘마통(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빌린 돈 등으로 1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지난주 급락한 증시에서 한 달 봉급을 날렸다고 호소하는 대기업 직원도 있다. 앞서 상승장에서 주가 하락 쪽에 베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개미 중에도 2030 청년층이 많다고 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월 7일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말(104조 7,330억 원)보다 1조 1,807억 원 증가한 수치로,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 원)을 단 1주일 만에 넘어섰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659억 원 급증하며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 신용대출도 1,148억 원 늘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와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순매도로 흔들렸던 증시가 다시 4,000선으로 반등한 배경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부발(發) 호재의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에서 최대 45%(지방세 제외)의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원천 징수한다. 애초 35%로 추진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반색했다. 이는 증시 ‘밸류업(Value-Up │ 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관심이 여전히 막대하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시장 심리에 편승해 정부가 증시 부양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걱정도 크다.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는 “제도(정부 정책)가 밀어 올리는 증시”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문제는 기업 실적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보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일으키는 자극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4%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마치 주가가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이 더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코스피 4,000 돌파는 국민의 자신감 회복”이라며 시장 과열을 축하하고, 일부 정치인은 길거리에 ‘코스피 4,000 시대 개막’ 현수막을 내걸었다. 작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지난주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은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 │ 일시적 업무정지)’ 불안,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부정적 시각까지 겹치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증시 활황’을 치적으로 포장하는 건 위험천만(危險千萬)하다.
주가지수 상승이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주도주를 중심으로 양극화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동력은 결국 성장성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코스닥 상장사 중 23.7%가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짜 성장’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호와 현실 간 괴리(乖離)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첨단기술 기반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높은 생산성과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에너지·환경 등 정부 정책 디테일(Detail)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혁신을 끌어낼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난달 일본 ‘닛케이지수(Nikkei 指數)’가 역사적 5만 선을 돌파한 데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더불어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됐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만 한다. 혁신을 깨우는 규제 완화와 신산업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의 결단과 노력 없이 ‘글로벌 자금 유입’과 ‘코스피 5,000 시대’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이거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29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94조 9,236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의 15.51%에 이른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406조 2,253억 원(10.59%)으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26.10%로 8월 29일 20.01%보다 6.0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65조 1,963억 원 │ 1.70%)를 더하면 비중은 27.80%까지 오른다. 이렇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곧 시장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다수 증권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근거로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앞다퉈 내놓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간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지수가 12개월 안에 5,0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휘청일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반도체 쏠림 속도를 늦춰야만 하고, 그러려면 결국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만 한다. 정책 초점을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인적자원, 신산업 전환 등 생산성 기반의 경기 부양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현재 빚투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15.8%)와 자본재(27.7%) 업종에 집중돼 단 한 번의 조정에도 증시 급락 위험이 큰 상황이다. ‘레버리지(Leverage)’로 생긴 거품은 외부 충격 한 번에도 터졌던 경험을 결단코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경우 정부와 정치권은 주식 투자는 자기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는 어처구니없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증시 성과는 마땅히 기업 실적과 경제 체력에서 비롯돼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더 늦기 전에 신용융자 관리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세워 실행으로 답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부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